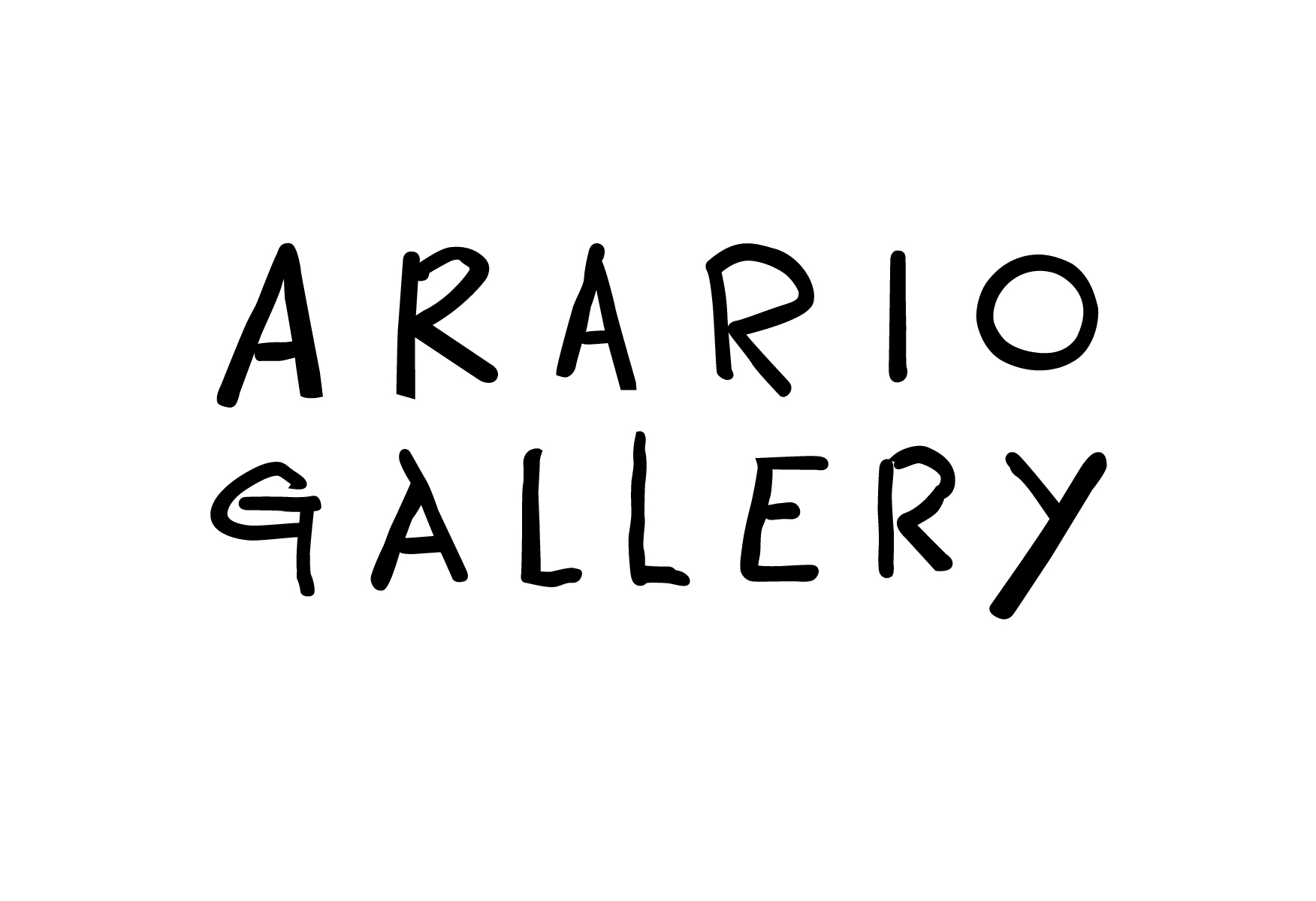LIM Youngsun : On the Earth
꿈꿀 권리 - 임영선의 에 대하여
조선령(독립 큐레이터)
캄보디아의 난민촌에서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잇는 아이들, 관광객을 상대로 강에?바나나를 파는 아이들, 사막화되고 있는 몽골 초원을 지키는 마지막 유목민의 아이들, 중국 오지의 사라져가는 소수민족 마을의 아이들...잊혀져가는 마을, 변방의 가난한 동네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지만 이 아이들은 당당하고 낙천적인 눈동자를 하고 있다. 어른들이 도시로 떠나고 남은 마을을 지키며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삶은 단지 어둡지만은 않다. 임영선은 아시아의 가난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지만 사회고발성 다큐멘터리 같은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아이들의 현실 속에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살짝 꿈의 공간을 끼워놓으며 이들의 일상이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조용히 응원한다. 꿈과 현실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희망은 현실을 벗어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누군가에게 꿈과 동경의 공간인 곳이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현실의 공간이다. 하지만 그 두 공간은 서로 섞이고 스며들어서 꿈과 현실 사이에 펼쳐진 고단하지만 단단한 희망의 장소를 새롭게 엮여 낸다.
각박한 생존의 현장인 쓰레기장은 색색의 화려한 스카프로 넘실대고 쓰레기봉지를 든 아이들 위로는 더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진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녀의 미소가 허름한 마을 길을 물들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매는 햇볕에 탄 검은 얼굴을 드러내며 해맑게 웃는다. 크고 맑은 아이의 눈에는 친구들의 꿈이 비친다.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단순한 호소 대신 작가는 이 아이들의 세계가 얼마나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시아 변방 마을의 아이들’이라는 소재는 꿈과 현실이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색다른 방법이 된다. 꿈꿀 권리, 그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매일의 나날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권리이다.
200호에서 500호에 이르는 커다란 캔버스에 기념비적으로 그려진 아이들의 사이즈는 이들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일반적인 유화물감의 사용법과는 좀 다르게 정교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칠해진 붓질은 사실주의적 기법이 자칫 가질 수 있는 부담을 덜어내면서 화면을 밝고 반짝이게 만든다. 가난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세계는 밝고 가볍게 표현되어 있다. 작가는 부분적인 묘사는 치밀하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여백을 많이 남겨 화면을 시원하게 하고 상상의 여지를 남겨둔다. 배경은 거의 그려져 있지 않거나 최대한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인물과 배경은 서로 섞이고 녹아 들면서 땅과 사람이 하나의 풍경으로 완성된다. 작가는 흰색이나 파스텔 톤으로 밑 칠을 한 캔버스 바탕이 드러나도록 물감을 위에 얇게 펴 발라 투명한 효과를 높였다. 세밀한 터치가 많이 들어간 배경은 반짝거리는 물의 표면이나 햇볕에 빛나는 조약돌처럼 보인다.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담하면서도 정밀한 묘사력이 이런 효과와 맞물려 화면을 힘 있게 만들어준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주로 정면을 보고 서 있거나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풍경들이 오버랩 되는 세로 작품들과, 자전거를 타거나 등을 보이고 뛰어가는 등 좀 더 다양한 포즈가 등장하고 배경에 푸른 하늘이 등장하는 가로 그림들. 전자가 아이들의 당당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크게 그려진 인물과 작게 그려진 풍경의 대비, 단순한 배경과 정교한 묘사의 대비를 통해 시원한 기념비적 느낌과 미묘한 몽환적 효과를 함께 갖고 있다면, 후자는 좀 더 암시적이고 시적인 느낌이 들며 더 깊이 있는 울림을 갖고 있다. 묘사방식이나 색채사용이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여전히 투명하고 맑다.
각각의 화면은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작가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며 한 장면에 다른 장면을 오버랩 시키는 기법으로 시각화한다.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서 있는 아이들의 옷자락이나 배경에는 이들이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고향의 풍경이나 친구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친다. 단발머리에 맨발을 한 자매의 옷에 비친 푸른 숲, 부처처럼 합장을 한 흰 옷 입은 소녀의 옷에 비치는 푸른 하늘과 나무, 까맣고 큰 눈동자를 하고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과 겹쳐지는, 소와 사람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풍경들이나 사람들은 분명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척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울 같은 오버랩의 효과를 통해 꿈과 동경의 공간으로 바뀐다. 거울은 작가와 관객 앞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하고 화면 속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특이한 거울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땅에서 하루하루를 챗바퀴돌며 살 수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딘가 이국의 땅을 상상하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국의 땅을 척박하고 힘든 현실로 겪어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땅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마술처럼 바꾸는 장치이기도 하다.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주변에 펼쳐진 풍경은 분명 이방인의 눈에 비친 그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본다는 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면 이방인이기에 작가는, 우리 관객들은, 이 풍경 속에서 오히려 매일 매일의 고단함이나 단조로움 사이로 열려서 빛을 내는 작은 틈새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시선을 되돌려 받아 완성된 아이들의 풍경은 희망으로 채색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맑은 눈으로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단지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중국 같은 특정한 나라의 이국적 풍경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이런 독특한 교차효과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이 만나면 그것들은 완전히 포개질 수가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우리는 일상이나 현실 같은 이름 속에 완전히 용해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설렘이나 빛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